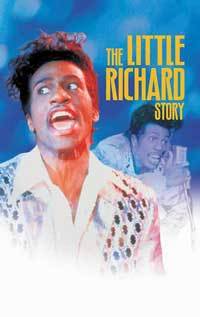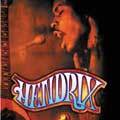(Hendrix)2000년, 감독 레온 이카소 출연 우드 해리스, 빌리 제인 장르 드라마(폭스)
그들은 어떻게 록의 전설이 되었는가. 어떻게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 동시대 청춘의 시청각을 포박하고 심장을 뛰게 했던가. 요란하게 부풀린 머리와 메이크업, 번쩍이는 재킷을 열어젖히며 엉덩이를 실룩대는 육감적인 무대 매너와 자유자재로 튀어오르는 목소리로 50년대 리듬 앤 블루스와 초기 로큰롤을 이끈 리틀 리차드. 그리고 거칠게 터지는 파열음과 피드백, 음과 음의 미세한 사이에서 꿈틀대며 울리는 와우와우 등 기타로 들려줄 수 있는 갖가지 사운드에 나른한 음색을 얹은 사이키델릭 블루스록으로 60년대 후반 록음악의 영역을 넓혔던 지미 헨드릭스. <리틀 리차드>와 <록의 전설 지미 헨드릭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TV용으로 제작된 이들의 전기영화다. 각자 한 시대를 풍미한 선후배 뮤지션의 음악과 생애를 담은 두 작품은 50∼60년대 록음악사를 이어서 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물론, 스타의 일대기라는 재료를 영화로 담는 방식에서도 비교의 재미를 준다.
우선 음악전기영화를 한 전력이 있는 감독 로버트 타운젠드와 배우 리온이 각각 연출과 주연을 맡은 <리틀 리차드>는 드라마적인 재구성에 충실하다. 보수적인 남부 조지아주 메이컨의 리차드 웨인 페니만, 치장과 노래를 좋아하던 소년이 교회에서 고스펠을 부르다가 ‘경박한’ 로큰롤에 눈뜨면서 시작된 음악 여정의 하이라이트 모음이랄까. 희가극 스타일의 보드빌쇼에 여장 출연하던 시절부터 클럽을 전전하고 스페셜티 레코드에서 <Tutti Frutti>를 불러 전국적인 스타덤에 오르는 과정은 열광적인 라이브의 연속. 남자답지 못한 아들을 다그치던 아버지와의 갈등 같은 개인사도 끼어들지만, 절묘하게 꺾였다가 뻗어가는 목소리, 피아노 위에 누워 건반을 부서져라 두드려대는 화려한 연주와 무대매너를 보여주는 리틀 리차드의 음악이 시종일관 영상을 장악한다. 를 “따라할 수 없도록” 흑인 특유의 빠른 리듬감으로 불러젖혀 그의 곡을 ‘백인적으로’ 바꿔부르던 스탠더드팝의 스타 팻 분을 쩔쩔 매게 만든 장면처럼, 흑인음악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50년대 제목소리를 낸 리틀 리차드. 요란스러울 만큼의 열정과 현시욕을 공유한 그의 캐릭터와 삶이 리온의 연기를 빌려 경쾌하게 재현됐다.
지미 헨드릭스의 인터뷰 형식으로 시작되는 <…헨드릭스>는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구성이 뒤섞여 있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화면의 질감을 달리한 이 가상의 인터뷰는 헨드릭스의 내면 탐사에 가깝다. 아버지에게 기타를 선물받던 기쁨과 어머니와 헤어져 살던 슬픔이 겹쳐져 있는 유년기 뉴욕 뒷골목 클럽을 전전하다 애니멀스의 베이스주자 채스 챈들러를 만나 런던에서 ‘지미 헨드릭스 익스피리언스’란 밴드로 먼저 성공을 거두고 67년 몬터레이 팝 페스티벌로 미국에 금의환향하는 드라마 틈틈이, 헨드릭스가 가졌을 법한 생각을 털어놓는다. <Wild Thing>을 부르다 기타를 등 뒤로 돌려치고 불태우는 몬터레이 공연이나, 기타 하나로 국가를 변주하며 베트남전과 미국의 폭력성을 조롱하는 우드스탁 무대는 빼놓을 수 없는 절정부. 음악보다 상품가치에 연연하며 쉴 틈없이 몰아붙이는 음반사와의 갈등 속에 마약과 섹스로 소진되는 과정의 묘사는 진부하기 짝이 없지만, 흑백 구분을 넘어선 음악을 꿈꾸며 실험을 향한 열병을 품었던 한 음악 천재의 흔적마저 바랠 정도는 아니다. <리멤버 타이탄>의 우드 해리스가 열연했으나, 헨드릭스의 음악 사용 허가를 얻지 못해 커버곡으로 채워야 했던 탓인지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지미 헨드릭스의 팬이라면 거듭 그의 부재가 실감날지도. 오는 9월18일, 지미 헨드릭스 사후 31주기를 맞는 밤에 그를 추억하기에는 더없는 작품이겠지만 말이다.
황혜림 기자 blaue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