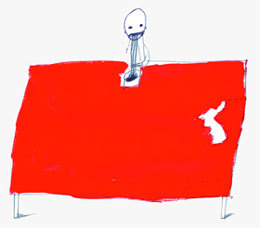잘 알다시피 역사는 일차적으로 시간에 관한 것이다. 지나간 시간을 현재와 연결하는 관념의 양상이 역사의 양상들을 결정한다. 때론 현재 당면한 사건을 위한 지침이나 교훈을 얻기 위한 참고자료의 집합이 되기도 하고, 때론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이해하게 해주는 이유들이 되기도 하며, 또 때론 현재를 만든 과거의 누적이 되기도 한다.
역사가 시간적인 것이지만, 역사에 시간 아닌 공간이 담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것인지도 모른다. 이 경우 공간이란 현재 불러낸 사건들이 발생한 지점이 공간적이라는 의미에서다. “그때 한나라에서는…”, “1789년 파리에서는…” 식으로. 이러한 역사의 공간을 ‘우리의 역사’, 혹은 ‘중국의 역사’ 하는 식으로,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 ‘영토’의 문제로 바꾸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영토국가가 지배하게 된 19세기 이후였다. 이런 19세기의 눈으로 볼 때, 15세기 유럽인들이 저 멀리 떨어진, 터키 옆의 나라 그리스를 자신의 고향으로 삼았다는 사실처럼 기이한 것도 없을 것이다.
이와 다른 차원에서 영토적인 관념 속에서도 역사는 필경 그 외부를 자신 안에 포함하게 된다. 가령 터키의 역사 없는 유럽사를 생각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 없는 유럽 역사를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터키는 유럽사의 일부에 포함되고, 아프리카는 유럽사의 일부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배운 유럽사에는 터키사가 빠져 있고 아프리카 역사가 삭제되어 있다. 그저 유럽사 자체의 발전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역사를 신비화하는 가장 흔한 방식이다. 역사 자체가 무슨 생명체라도 되는 양. 역사가 영토국가의 역사가 되어 스스로 발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런 근대적 신비주의의 전형적 관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분명 고구려사는 중국사의 일부다. 아니 한국사 전체가 중국사의 일부다. 어디 한국뿐일까? 몽골의 역사, 만주족의 역사, 아니 훈족의 역사 없는 중국사가 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불가사의하다는 저 만리장성은 훈족에 대한 공포 없인 있을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천단과 자금성의 지붕에는 몽골족의 흔적이, 심지어 티베트인들의 흔적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지 않은가?
이런 게 아니라면, 고구려사나 몽골사를 중국의 역사의 일부로 포함한다는 말은 대체 무엇일까? 혹여 흔히 비판하듯 역사의 영유를 통해 영토를 영유하려는 것일까? 그러나 역사를 영유함으로써 영토를 영유할 수 있을까? 그 경우 역사란 대체 무엇일까? “우리 땅”에 속했던 과거 사실의 집합? 그래서 그들은 티베트인들의 거대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티베트를 중국의 일부로 만들었던 것일 게다. 그렇다면 몽골인들이 중국의 대부분을 장악했던 역사를 들어서 그것을 몽골의 영토라고 선언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비난할 수 있을까? 대칭성 내지 상대주의를 면할 수 없는, 저 제국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소박한 역사관념이, 제국주의가 이미 낡은 것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사회주의 깃발 아래 슬며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어이없고 씁쓸한 일이다.
차라리 나는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국 역사의 일부로 인정하겠다는 말을 아주 전향적인 것으로 듣고 싶다. 좀더 적극적으로 몽골의 역사, 훈족의 역사까지 그렇게 인정하길 바란다. 그래서 훈족과의 관계 속에서 진이나 한의 역사를 서술하고, 몽골의 역사와 연관해서 중국사 전체를 다시 서술하기를 바란다. 중국의 문명을 그런 외부의 민족들, 이질적 문화를 갖고 있던 이민족들과의 대결과 타협, 교류와 변형을 통해 탄생하는 것으로 서술하게 되길 바란다. 이는 아마도 자국의 우월성과 문명을 가정하고는 그것의 확대와 팽창으로, 혹은 그것에 대한 장애와 무지로 주변국을 몰아붙이는 제국적인 역사, 그 신비주의적 역사관념을 넘어서는 길이 되지 않을까? 더불어 우리 또한 자신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다루던 소중화주의가 아니라, 중국사를 한국사의 일부로 다루는 다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역사가 어디서나 쉽게 발견되는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라는 턱없는 자만 대신, 우리는 타자들, 이민족들과 만남- 그게 우호적인 것이든 적대적인 것이든- 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역사의 경계선마다 꽃으로 피어나기를!
이진경/ 연구공간 ‘수유+너머’ 연구원·서울산업대 교양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