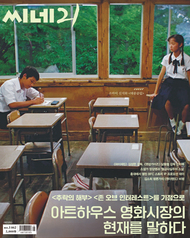<너를 보내는 숲>의 원제는 <모가리 노 모리>, 우리말로는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숲’이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보지 않아도 주인공들이 누군가를 애도하는 그렇고 그런 암울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지만 제목이 애도라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애도하는 ‘장소’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애도는 그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그곳은 험악한 산속이며 내가 사는 이곳은 그곳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긴장관계가 성립한다. 더 어려운 점은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점은) 그곳이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치매 노인이 ‘이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숲을 뚫고 가야 도착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진짜 주제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잇는 정처없는 여행이다. 이 영화가 흥미로운 점은 애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이곳’도 아니고 애도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저곳’도 아닌, 그 사이를 채우는 여정의 의미를 묻는다는 사실이다.
영화의 중·후반은 숲 한가운데를 본격적으로 탐사하는 남녀의 힘겨운 여행으로 채워져 있다. 둘은 노인 요양원의 간병인과 어린아이 같은 노인이다. 보호하는 자와 보호받는 자. 노인은 끊임없이 그녀의 시야를 벗어나고 무작위의 코스로 달린다. 그녀는 노인을 따라잡기에 힘겹다. 이 둘의 관계는 철학의 수많은 변증법을 연상케 한다. 각각에게는 나름의 트라우마가 있다. 간병인 마치코는 자신이 개울에서 손을 놓아 아이가 죽었다는 죄책감을 이고 산다. 치매 노인 시게키는 아내와 33년 전에 사별했다. 그는 33주기 기일을 맞아 자신만의 의식을 치러야만 아내가 부처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굳게 믿고 있다. 영화는 이들이 계곡에서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신체가 고생하는 각각의 어려운 순간을 절묘하게도 정신의 벽이 단계적으로 터져나가는 순간과 일치시킨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수행의 과정이다. 개울을 건너는 과정에서 과거의 악몽이 그녀에게 엄습한다. ‘정상인’이 무너져내리자 치매 노인은 “강물은 끊임없이 흐를 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 영화의 핵심을 말한다. 모닥불로 밤을 지새우는 신에서 그녀는 가슴을 드러내고 저체온에 시달리는 노인의 등을 비빈다. 중요한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상징들, 갑자기 쓰러지는 나무와 거대한 고목 등이 숲의 시공간 곳곳에 산재해 있다.
사진이나 그림은 어떤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는 데 주력한다. 반면에 영화는 순간에 담긴 큰 의미를 시간의 ‘지연’ 속에서 표현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의 관건은 의미있는 순간들을 선택하여 ‘지연’의 과정으로 잘게 쪼개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가와세 감독은 ‘지연’의 마술사 같다. 우리가 한 단어로 호칭하면서 무심결에 스쳐지나가는 느낌, 동작, 사건들을 그녀는 붙잡고 늘어지며 ‘지연’시킨다. 하나가 ‘지연’되면 다른 것은 순간적인 ‘출현’으로 압축된다. <사라소주>에서 지연된 것은 일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의 순간들이었다. 실종된 장남(혹은 형)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긴 시간은 기나긴 하굣길의 미로, 주인공들의 얼굴에 매달린 얼어붙은 시간 덩어리들로 이미지화한다. 그리하여 ‘지연’은 고통을 그 영화 특유의 침묵과 절제, 애틋한 느낌으로 변형시킨다. 반면에 마을 축제와 어머니의 출산은 ‘출현’의 순간이었고 이것은 앞의 ‘지연’과 병치되면서 카타르시스 효과를 낳았다. 그 영화가 극단적 감정을 ‘지연’시키고 평이한 ‘일상’을 출현시켰다면 <너를 보내는 숲>은 이와 정반대의 배열을 보인다. 영화 앞부분에서 두 남녀가 회상하는 아픈 과거는 톡톡 쏘는 숏의 ‘출현’으로 다루어진다. 노인은 아내와 이름이 비슷한 마치코 이름의 붓글씨를 마구 먹칠한다. 애도의 장소에 도착하여 축하의 퍼포먼스를 벌이는 라스트신은 스틸 사진에 버금갈 정도로 함축적이며 정태적이다. 반면에 ‘애도의 필요’와 ‘애도 행위’를 연결하는 사이 시간은 무려 1박2일의 험난한 산길 여행으로 ‘지연’된다. 이것은 애도의 보통 의미를 180도 바꿔놓는다. 애도란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정신적 짐을 제거한다든가 이미 죽은 사람과 화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애도란 애도자들이 협동하여 체득하는 험난한 트레이닝, 미래를 향한 생산적 에너지의 비축, 아니 차라리 마을 축제나 온 가족이 응원하는 출산 같은 것이다.
“애도자에게 지옥훈련을!”이라는 말은 생뚱맞게 들리지만 영화적으로는 자연스럽다. 가와세 감독은 전작 특유의 잔잔한 프레임들을 유지하면서도 역동적인 국면으로 연착륙하는 데 성공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