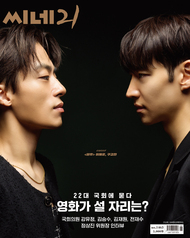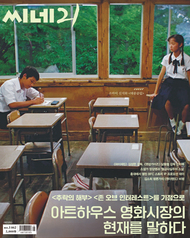1981년. 대학교 새내기가 되어 봄의 기운이 완연한 교정 한복판에 할 일 없이 앉아 있을 때 ‘데모’라는 것이 일어났다. 시위는 10분 이상을 끌지 못한 채 초동 진압되었고, 주동자는 개 패이듯 두들겨맞은 뒤 두팔이 묶인 채 어디론가 끌려갔다. 그때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랬듯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무수한 생각들이 머리 속을 교차했다. 그중 하나는 “나도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비록 마음은 전쟁을 치르더라도 몸은 그럭저럭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새내기의 기대는 그렇게 무너져내렸다. 2년 뒤인 1983년 여름 수사기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진술’을 했을 때는 막연한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줄 알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과자가 되는 것은 피했고 그 대신 철책선 가까이 있는 군부대라는 낯선 곳에서 낯선 생활을 해야 했다(이런 황당한 인권 침해를 ‘지나간 일’로 덮어두는 나의 비겁에 대해 가끔씩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가족들은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을 피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위로를 보냈지만, 나로서는 ‘차라리 그것만 못한 일’이었다. 그때 전과란 명예로운 훈장 비슷했으니까.
1991년. 나는 마침내 전과자라는 딱지를 달게 되었다. 재야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나는 ‘이적표현물’을 저술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적표현물 중에는 학위논문도 포함돼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은 황당했다. 팔목에 수갑이 채워질 때의 공포보다 팔이 아프도록 자술서와 조서를 쓸 때의 피곤이 더 많이 기억날 정도로. 사건 직후 밖에서는 동료들의 항의가 있었고 안에서는 ‘양심수’라고 우대받으면서 집단적 힘을 과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 사건은 (가족을 제외한다면) 개인의 외로운 싸움이 되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반년 만에 다시 나온 세상은 그세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한마디로 전과는 이제 더이상 훈장이 아니었다. 그걸 바랄 정도로 미욱하진 않았지만 ‘어리석은 짓’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은 낯설었다. 자기를 추스르는 과정에서 집단의 위안이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다들 그렇게 살았겠지만.
2001년. 이제 곧 ‘전과 2범’이 될 전망이다.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교통사고가 나의 일이 되고 말았고, 경황없고 초조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들락거리면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피해자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을 면한 정도고, 가해자인 나도 인신이 구속될 확률이 줄어든 걸 빼면 그닥 좋지 않다. 이전의 사건들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에 (역시 가족을 제외하고는) 기댈 곳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도 잘한 짓과는 거리가 먼 개인사에 대해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사람의 도움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리라.
여기까지 쓰다보니 ‘갈수록 사회가 개인화되면서 믿을 곳이라곤 가족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오해할지 모르겠다. 그렇다기보다는 믿을 곳이라곤 가족밖에 없게 만드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리다. 이 원리의 효과는 피해자 가족의 선의를 '바보짓'으로 만들어버리고 가해자 가족의 형편도 ‘잔머리’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제도에서 극대화된다. 이 제도 앞에서 양 가족의 구성원들은 똘똘 뭉쳐 전면전을 펼치듯 대응할 수밖에 없고, 본의 아니게 인생의 험로 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흥정의 대상으로 만든다(또 하나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다). 만약 입장이 반대가 된다면 배우만 바뀌고 연기는 똑같을 것이다. 연민과 동정의 감정이 있든 없든 큰 상관이 없고,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처리해야 하므로 시간도 많지 않다. ‘합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제도는 감정과 윤리의 문제를 이성과 경제의 문제(쉽게 말해서 ‘돈 문제’)로 해결하라는 해괴한 제도다(이런 제도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진심으로 고민하다가 원고마감 시한마저 잊고 말았다.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공적 지면에서 떠벌려도 되는가라는 질문은 이제야 겨우 떠올랐다.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신현준/ 문화 에세이스트 http://shinhyunjoon.com.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