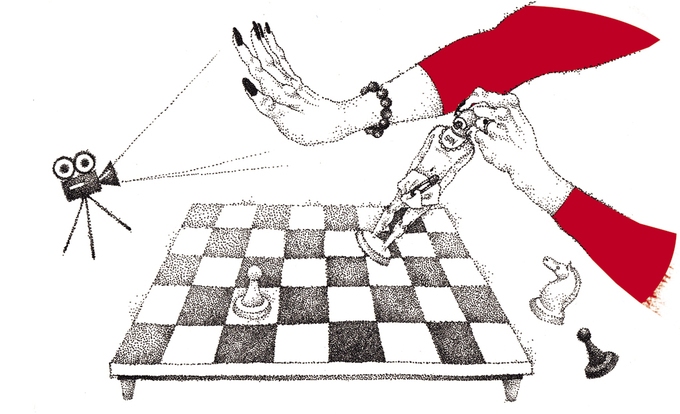대니얼 데이 루이스, 게리 올드먼, 러셀 크로, 윌 스미스, 대니얼 크레이그, 콜린 파렐, 콜린 퍼스, 양조위…. 이들 배우의 리스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한번 이상 퀴어영화를 찍은 경험이 있다.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에서 길고 붉은 혓바닥을 내밀던 대니얼 데이 루이스, 공중화장실 천장의 전등들을 죄다 부수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귀를 기울여>의 게리 올드먼, <싱글맨>까지 해서 4편의 게이영화를 찍은 콜린 퍼스, <세상 끝의 집>에서 성기 노출을 했지만 개봉 당시 그 장면이 삭제되자 항의했던 콜린 파렐 등 이 리스트와 그들이 빛낸 보석 같은 장면들은 천일야화처럼 지루하게 늘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전시 자체가 어눌하다. 이미 한국에서도 퀴어영화에 출연하면 그 용기가 상찬되고 연기력에 대해서도 더 높게 쳐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심지어 신인배우들의 등용문으로까지 이야기되니까. 그런 까닭에 퀴어영화 제작진도 이 점을 캐스팅의 지렛대로 사용하곤 한다. 유혹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벌벌 떨며 나에게 “호모가 싫어요!”라고 이승복 어린이처럼 외치던 90년대를 지나, 캐스팅 거절의 손사래 속에서 찍었던 <후회하지 않아>를 경유해 6년 만에 퀴어영화를 찍은 올해, 사정이 더 나빠졌다는 걸 깨달았다. 더 은밀하게 유치해졌다.
<백야>의 경우, 캐스팅 과정만 3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 시나리오를 읽기도 전에 게이영화란 소리를 듣고 단번에 거절했던 배우들은 사실 지루할 뿐 그다지 새롭지도 않다. 오히려 날 놀라게 한 건 배우 본인은 정작 출연하고 싶어 했지만, 그 부모들에 의해 캐스팅이 번번이 무산되었다는 점이다. 소식을 듣고 한손에 성경책을 들고 울부짖었다는 어떤 배우의 어머니, 소속사를 발칵 뒤집어놓았다는 어떤 신인의 재력가 아버지 등등 졸지에 나는 배우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을 캐스팅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야 했다. 맙소사, 오디션하는 배우들에게 “당신 부모를 먼저 설득하고 연락하세요”라는 말을 부적처럼 늘어놓기 일쑤였다.
자기 삶의 결정권, 그 선택을 부모들에게 양도한 마마보이 배우들. 어쩌면 실존적 권리를 양도한 그 시대적 ‘미성년’들은 점점 보수화되는 한국사회의 징후인지도 모르겠다. 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보수화되었던 미국에서 청년들이 자율성을 상실하고 점점 유아기로 퇴행하는 경향을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불렀던 바, 퀴어영화 캐스팅을 위해 만났던 그 수많은 젊은 배우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 나약한 피터팬들!”이라고 외쳤다.
아마 시대적 풍경이겠다. 퀴어영화 배우들을 찾다가, 신자유주의 토대 위에서 스펙과 돈과 명성과 스타가 되려는 욕망을 허겁지겁 쫓지만 정작 부모로 상징되는 거대한 ‘대타자’들에게 자신의 실존적 결단을 양도한 야위고 빈곤한 우리 시대의 청년들을 만났는지도 모르겠다. 자못 슬픈 일이다.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을 제대로 표현하는 배우가 되겠는가. 여기, 한국의 젊은 배우들은 그렇게 아찔하게 미성년으로 살아가나 보다. 용기들 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