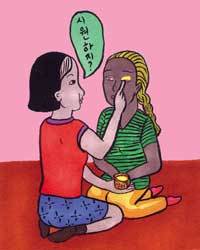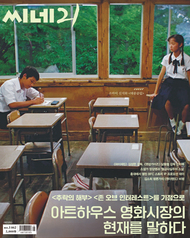내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가 있었다. 우리는 다른 대학을 갔지만 서로의 학교에서 살다시피했고 2년쯤 함께 자취를 했다. 그 모든 차이(10·26 다음날 아침 라디오에서 나오는 장송곡 메들리를 들으면서 나는 묵은 빨래를 꺼내 신나게 빨아댔고 내 친구는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하면서 내 인품의 경박함을 안타까워했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정이 지속됐던 건, 그 을씨년스럽던 야간자율학습을 함께하며 서로 눈꺼풀에 안티푸라민 발라주면서 싹튼 우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겨났다. 20대 중반쯤이었는데, 각기 사회활동 영역이 달라진 건 별 문제가 아니었다. 영혼의 영역이 달라진 것에 비하면. 내 친구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패거리 여섯 가운데 나머지 넷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친구들은 나를 볼 때 “쯧쯧, 저 길 잃은 양을 어떻게 하나” 하는 근심스런 표정이 역력했고, 나는 외로움을 달래며 “하느님이 내 친구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 하고 탄식했다. 종교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했다. 대개,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려는데 내가 강력히 저항해서 분쟁으로 번지는 수순이었다.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사람도 하나님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보다 더 불행하다’는 논리를 폈다. 나도 하나님의 부재 증명들을 제시했다. 종교전쟁 타령을 했고 볼테르의 <깡디드>를 거론했다. 세상은 부조리투성인데 다 신의 섭리로 믿는 거야말로 ‘순진한 녀석’(깡디드)이지. 분쟁이 과열되면 ‘구원’, ‘지옥’, 또는 ‘맹신’, ‘사이비’ 같은 험악한 말도 튀어나왔다. 우리가 휴전에 암묵적인 합의를 한 건 20대 막바지였다. 서로 정신적 존재기반을 더이상 공격당하고 싶지 않아졌던 것이다. 사실 영혼의 소속이 다른 것만 빼면 우린 아직 비슷한 점이 많았고 그냥 친구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가끔, 나이 들어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한 대학 학생상담소에서 일하는 그 친구와 최근 밥먹다가 우리는 엉겁결에 휴전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 앗, 지뢰밭! 하지만 분쟁은 없었다. 우리에겐 어느새 관용의 태도가 생겨나 있었다. 얘기는 내가 먼저 꺼낸 것 같다.
“영화감독들 가운데는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작품을 망치는 경우도 있어. 세상일에 다 질서가 있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모두 하느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현실을 냉정히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것 아닐까. 난 그런 게 싫어.”
“그래,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 그건 미성숙의 소치라고 봐. 신앙도 인격하고 같이 성숙하거든. 내게 하나님의 섭리란 이런 거야. 내 욕구나 바람이 내게는 절대적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다를 수도 있거든. 절대자의 뜻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상대화시켜보는 거야. 그게 때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종교의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해. 종교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 내 소설에서 정신과 의사가 나환자촌의 소년이나 일가족을 잃은 아주머니에게 신앙심을 굳게 가지라고 하잖아. 칼 융도 정신과적 처방으로 종교를 이야기했지.”
“맞아. 강박증이나 편집증도 기본신뢰감이 결여돼서 생겨나는 거라고 봐. 상담현장에서 이런 기본적인 신뢰감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안타깝더라. 세상에 믿어서 손해보는 것보다 못 믿어서 손해보는 것이 훨씬 많구나, 싶어. 종교란 기본적인 신뢰감이거든. 종교 없는 사람들이 대단해. 그 어마어마한 불안을 어떻게 견뎌내는 거지”
“불안하지.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예기치 않은 불행에 대해 속수무책이니까. 하느님을 믿으면 빽이 생기니까 불안감이 덜 할 텐데. 죽음이라는 것도 두렵고. 하지만 숨고 싶지는 않은 거야. 세상이 그런 거라면 그대로 마주봐야 한다는 생각이지.”
“너의 그 치열하고 솔직하고 당당한 삶의 태도를 존경해. 근데 왠지 좀 고독해보여. 독립과 자율도 의존 없이는 있을 수 없어. 내게 믿음이란 찌그러지고 상처받은 마음이 펴지고 회복되는, 그래서 또 희망을 잃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것이야. 네 말대로 기대고 비빌 언덕이지.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 많이 해. 성숙한 사람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비기독교적인 형태로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네 소설의 주인공도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조선희/ 소설가·전 <씨네21>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