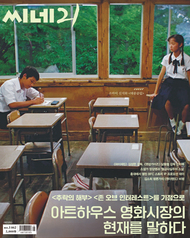2008년 1월의 극장가는 언뜻 보면 외화 베스트 걸작선이다. <무방비도시> <뜨거운 것이 좋아> <원스 어폰 어 타임> 등 제목만 보면 역대 외국영화 가운데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들의 다시 보기 행사 같기도 하다. 그동안에도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가 관객의 귀에 익숙한 외국영화의 제목들을 차용하곤 했지만, 이런 영화들이 1주 차이를 두고 이어지는 풍경은 생경하다. 좀더 민감하게 굴자면 해당되는 영화는 더 많다. <라듸오 데이즈>는 우리 알렌의 동명영화에서, 2월에 개봉하는 <대한이, 민국씨>의 원래 제목인 <인생은 아름다워>는 로베르토 베니니의 영화에서 가져온 제목이다. 이건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요즘 한국영화 마케팅의 한 추세인 걸까.
물론 이 영화들은 내용으로 볼 때 제목의 원작과 무관한 작품들이다. 김명민, 손예진이 주연한 <무방비도시>는 소매치기와 형사, 그리고 형사의 소매치기 엄마가 벌이는 범죄드라마고,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이 1945년에 만든 <무방비도시>는 2차대전 말기를 배경으로 한 레지스탕스의 이야기다. 김민희가 주연한 <뜨거운 것이 좋아>는 한집에 사는 세 여자의 연애담이며, 마릴린 먼로가 주연한 1959년산 <뜨거운 것이 좋아>는 여장남자를 소재로한 코미디영화다. 그런가 하면 <원스 어폰 어 타임>은 어떤 영화의 제목을 차용했는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부터 <~인 미들랜드> <~인 멕시코> <~인 웨스트>등 감독과 배우, 시대와 이야기가 다른 여러 영화들이 있기 때문. <원스 어폰 어 타임>을 홍보하는 아이엠픽쳐스의 유정미 과장은 “기획단계에서는 우리끼리 그냥 ‘원스’라고 불렀는 데, 진짜 <원스>가 나오면서 지금은 우리끼리도 애써 풀 네임으로 지칭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화의 이름값이 필요했던 이유
한국영화들이 외화의 제목을 빌려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달콤한 인생> <용서받지 못한 자> <분홍신> <비열한 거리> <위대한 유산> <공공의 적> 등도 마찬가지 사례이고. 좀더 멀리 가자면 <돈을 갖고 튀어라> <러브스토리> <런어웨이>도 있다. 개봉을 앞둔 영화들 중에서도 수두룩하다. 안성기, 조한선 주연의 <마이 뉴 파트너>는 한때 <투캅스>와 표절시비가 붙던 프랑스영화의 제목을 가져왔으며 김지운 감독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석양의 무법자>의 원제인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에서 따온 것이다. 이완, 송창의 주연의 <소년은 울지 않는다>는 동명 외화에서 제목을 따온 것에 더해 영문제목은 다른 영화에서 가져왔다. 바로 <Once Upon a Time in Korea>. 사실 문제 삼기가 어색할 만큼 많은 영화들이 외화의 제목을 차용하고 있고, 차용해오고 있는 것이다.
넘겨짚자면 이들이 외국영화의 제목을 차용한 것은 관객의 귀에 쉽게 꽂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목을 지은 이들은 그 점에 동의하면서도 저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 <무방비도시>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이상기 감독은 자신이 정한 제목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1년 넘게 취재를 하면서, 시민들이 소매치기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떠올린 제목이지만, 나름대로는 로셀리니 감독의 <무방비도시>가 네오리얼리즘의 효시인 작품인 만큼,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잘 만들어보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웃음)” <무방비도시>란 제목이 어느 정도 고전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있다면, <원스 어폰 어 타임>은 영화의 컨셉에서 착안한 제목이다. 유정미 과장은 “<원스 어폰 어 타임>은 긴장감있는 드라마에 유머를 가미한 오락영화”라며 “민족주의적인 시선을 담거나 고민하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옛날 옛적에’ 있었을 법한 재밌는 이야기로 보이게끔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뜨거운 것이 좋아>는 기획영화답게 철저히 제작사와 마케터들이 모여 장시간의 회의 끝에 만든 제목이다. 가제로 ‘미친 그녀들’이란 제목을 생각했던 권칠인 감독도 “나는 별로 소신이 없어서 회사가 하자는 대로 갔다”고 말한다. “물론 제목에 감독의 테마와 의지를 녹일 수 있겠지만, 사실 나는 타협을 잘하는 감독이다. (웃음)” 회의 안건으로 ‘뜨거운 것이 좋아’를 내놓았던 당사자인 홍보사 퍼스트룩의 이윤정 실장은 “영화가 쿨한 척하는 건 재미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며 “사랑도 일도 뜨겁게 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만든 제목”이라고 말했다. ‘미친 그녀들’ 외에도 ‘나는 아름답다’라는 선언적인 문구부터 ‘레이디 코믹스’처럼 영화의 장르를 새롭게 규정하는 제목, 그리고 ‘여우와 신포도’ 같은 다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듯한 제목도 있었다고. “‘굿모닝 싱글’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감독님의 전작인 <싱글즈>와 비슷해서 접었다. (웃음)” 말하자면 <원스 어폰 어 타임>과 <뜨거운 것이 좋아>는 고전영화를 의식했다기보다는 단어와 문장이 전하는 뜻과 어감에 주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영화 인지도 상승에 플러스 기대
물론 영화의 제목은 잡지의 제호나 업체의 상호와 달라 신고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영화의 제목을 가져왔다고 해도 그것이 저작권법에 걸리거나 할 일은 없다. 영화제목의 본질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 말고도 ‘낚시’에 있다면 이들 영화의 제목은 나름대로 효과적인 미끼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이런 제목이 관객동원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 아직 영화들이 개봉성적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짐작하긴 힘들지만, 마케터들은 인지도 상승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화의 내적 의미를 전달하고 상업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는 <뜨거운 것이 좋아> 외에 다른 두 영화는 마케팅 측면에서 컨셉을 맞추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무방비도시>를 홍보하는 이가영화사의 심명희 팀장은 “제목 때문에 마치 사이즈가 큰 SF영화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소매치기의 이야기라는 것과 제목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결국 지금 <무방비도시>는 이상기 감독의 말대로 소매치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도시라는 설정에 부합해 소매치기 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펼치는 중이다. 아이임픽쳐스의 유정미 과장 또한 “<원스 어폰 어 타임>이란 제목이 영화의 정보를 한번에 전달하기에는 어려운 제목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할리우드에서 만든 B급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패러디영화 같은 느낌도 있지 않나. 하지만 제목에 많은 정보를 담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도 이 제목이 맞는 것 같다. (웃음)” 하지만 유정미 과장은 “마케팅이 제목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며 “비주얼과 이야기로 승부한다면 관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유명한 영화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영화가 안좋을 경우에는 영화 리뷰에 좋지 않은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말하자면 “왜 위대한 영화의 명예를 훼손시키냐”는 등의 비아냥을 듣기 쉽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사소한 우려일 뿐이지만, 같은 시기에 모인 한국영화들이 외국영화의 제목을 차용해 내걸고 있는 지금의 풍경이 낯설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제목을 쓴 걸작만큼 영화를 잘 만들어보자는 욕심이 있었다”
<무방비도시>의 이상기 감독 인터뷰
-요즘 외국영화의 제목을 차용한 영화들이 많다. <무방비도시>도 그중 한편이다. 어떻게 지은 제목인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1월에 3편이 겹쳐서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다. 시나리오를 쓰면서 1년 넘게 취재를 하다보니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소매치기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무방비도시’로 지으면 어떨까 싶었다. 영어 제목인 ‘Open City’도 그대로 가져왔는데, 소매치기에게 사람들의 지갑이 오픈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다.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무방비도시>를 의식한 건 없었나. =아무래도 영화를 공부하면서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영화를 많이 보긴 했다. <무방비도시>는 또 네오리얼리즘의 효시가 된 영화 아닌가. 나름대로는 그만큼까지는 아니어도 영화를 잘 만들어보자는 다짐이 있었다. 또 당시 로셀리니가 열악한 여건에서 카메라만 들고나가 찍었던 영화였는데, 우리도 그런 헝그리 정신으로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다 보니 실제로 허가도 받지 않고 명동 한복판에서 스테디캠을 들고 몰래 촬영하기도 했지만. (웃음)
-하지만 세계적인 걸작의 제목을 가져오면서 느끼는 부담도 있지 않았을까. =세계 영화사에 한획을 긋는 작품이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싶어 부담이 되기도 한다. (웃음) 하지만 장르나 내용에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큰 비교대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제목의 느낌을 영화에서 이미지화하려고 했던 건 있다. 특히 영화의 첫 부분에서 도시의 느낌을 담기 위해 발품을 많이 팔고 다니며 촬영했다.
-<무방비도시> 말고 생각했던 다른 제목은 어떤 게 있나. =‘필’이라는 거였다. 영화에도 나오지만 소매치기들이 면도날을 개조해 만든 소매치기 도구다. 자문역이었던 남대문경찰서의 오연수 반장님은 그게 좋다고 했는데, 나는 좀더 광의적인 제목이 있었으면 했다. 나름대로 영화를 통해 운명 앞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라는 의미를 드러냈으면 했다. 또 어느 정도 영화의 무게감을 지탱해주는 것 같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