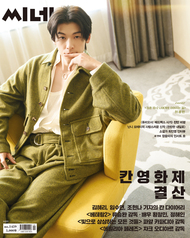<백 투더 퓨처>에서 마이클 J. 폭스가 50년대로 돌아갔을 때, 훗날 그의 어머니가 될 소녀가 그를 ‘캘빈’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는 요즘과 달리 의류회사나 디자이너의 이름을 써붙인 옷이 없었는데 그녀는 마이클 J. 폭스의 청바지에 붙은 ‘캘빈 클라인’을 그의 명찰로 알았던 것이다. 이를 일찍이 ‘현시적 소비’라고 부른 사람은 <유한계급론>의 베블린이다. 상품의 내용보다는 그 이미지가 훨씬 중요해지는 소비경향, 즉 현시적 소비는 오늘날 부르디외의 ‘구별짓기’에 이르러 가히 첨단을 달리고 있다. 그 옛날 걸어다니던 영화 광고, 샌드위치맨처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 고액을 들여 스웨터를 사입고 캡을 쓰는 것은 아닐까. 아마 우리 역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사람들이 ‘미찌코’, ‘폴로’, ‘토미’라고 부르지 않을까.
같은 관점에서 현대를 ‘맥도널드화 사회’라고 부른 사람은 미국의 조지 리처다. 그는 맥도널드 매장관리 시스템을 재치있게 분석하면서 이 경영 기법이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확산되었다고 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맥도널드를 위해 줄을 서고 식판을 들고 규격화된 자리에 앉아 재빨리 먹은 뒤 깨끗이 치워주기까지 하면서 그 행위를 즐거운 식생활로 여긴다. 우리는 극장과 자동차회사와 대학교를 위해서 산다고 해도 심한 말이 아니다. 공장에서 조립하고 소비자가 테스트한 뒤 A/S센터에서 완성한다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실상도 그렇고 비 새는 강의실에 낡은 칠판, 게다가 ‘천하의 명강의도 휴강보다 못하다’는 금언을 자주 써먹는 교수들을 위해 수백만원씩 내는 가치의 전도 현상은 가히 맥도널드화의 전형이다.
정작 할 얘기는 이제부터인데, 나는 이러한 가치의 전도를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자주 발견한다. 얼마 전 방영된, 백혈병 어린이를 위한 댄스그룹 god의 이벤트야말로 그 생생한 사례로서 과연 누가 누구를 위해 이벤트를 해준 격인지 의아스럽다. 그 많은 공연들 앞에 붙는 수식어들, ‘장애인을 위한’, ‘아프리카 난민을 위한’, ‘지구 환경을 위한’, ‘실직 가장을 위한’ 수많은 이벤트들의 수혜자는 과연 누구인가. 물론 세상 모든 일이 짜고 치는 고스톱은 분명 아닐 것이며 공연 수익금 중 일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것이기에 그러한 이벤트 전체를 평가절하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러한 이벤트를 마주할 때마다 심정적으로 불편하다. 도덕사회를 향한 그 어떤 마음의 준비도, 제도적 개혁의 노력도 속시원히 못하는 상황에서 숱한 이벤트 공연과 ARS 성금 적립 이벤트는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벌이는, 우리 자신을 위한 위선의 세레모니는 아닐까, 의심스러운 것이다.
영화 <하루>는 이 점에서 유의할 만하다. 영화가 윤리학을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함부로 벗어나서도 곤란하다. 영화의 문법은 물론이고 당대의 윤리의식에 대하여 어퍼컷을 날릴 자세로 정면으로 맞선 정신적 실험의 소산이라면 모를까, 지극히 상업적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영화라면 돈을 벌어도 최소한의 도덕적 선을 공유하면서 벌어야 하지 않을까. <하루>는 무뇌아의 고통을 그물코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감독이 그 고통을 철학적, 윤리적으로 깊이있게 들여다보았는지, 영화의 사이사이, 매우 의심스럽다. 기발한 소재, 재미있는 착상, 애틋한 사연…. 다 좋은 얘기지만 혹시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내면 깊숙이 당당한지 조심스럽게 묻고 싶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무신론자 이반은 이런 예를 든다. 어느 폭군이 있었고 그 폭군의 개에게 상처를 입힌 아이가 있었다. 폭군은 아이의 옷을 벗겨 도망치게 하고는 사냥개를 죄다 풀어 쫓아가 잡아먹게 하였다. 또한 그 참혹한 광경을 아이의 어머니가 보도록 하였다. 만일 이 처참한 상황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죽음을 슬퍼하고 또한 놀라운 믿음으로 폭군마저 용서한다면, 그러한 믿음과 용서는 결코 바라지 않겠노라고 이반은 말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진리도 어린이의 고통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이반은, 어머니는 아이를 잃은 어머니로서의 고통에 한해서만 용서할 권리가 있을 뿐 갈기갈기 찢겨 죽은 아이의 고통까지 용서할 권리는 없다고 말한다. 덧붙이길 행복과 평화의 탑을 쌓아올리되 죄없는 아이의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야 그 탑을 쌓을 수 있다면 그러한 가설조차 동의하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보상받을 수 없는 고뇌와 풀릴 길 없는 분노를 품은 채 남아 있겠노라고 선언한다.
혹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통스런 확인과 화해할 수 없는 분노가 아닐까. <하루>에서 고소영은 매우 몰인정한 의료진을 향해 울분의 대사를 던지는데 그 식상한 장면과 낡은 대사들은 영화 <하루>가 윤리적 깊이를 상실한 영화임을 심각하게 확인시켜준다.
정윤수/ 문화평론가 pragu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