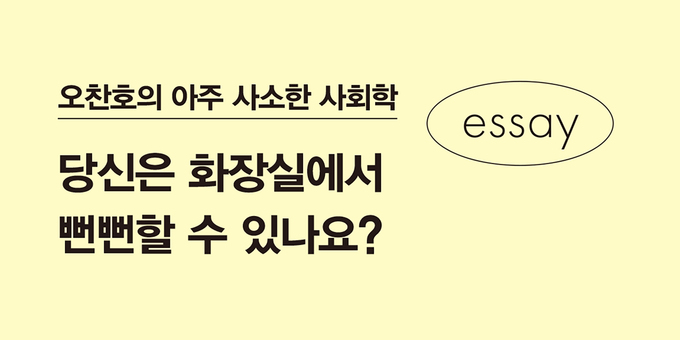제주에서 몇년간 살면서 비행기를 자주 이용했다. 그래서 잘 안다. 전국 모든 공항의 화장실 위치를, 그리고 비교적 한산한 곳이 어디인지를 말이다. 나처럼 옆 칸에 누가 있으면 볼일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에겐 대단히 중요한 정보다.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는지 부어 먹는지 따위를 묻는 대중적 심리검사를 좋아하지 않지만, 문항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걸 꼭 넣고 싶다. 당신은 화장실에 누가 있든 말든 앉자마자 볼일을 볼 수 있는가를. 조용하게 대장을 빠져나와 물속으로 자연스레 스며드는 바나나 모양의 물체가 아니라, 뿌지직뿌지직거리며 내 장 상태가 어떤지를 만천하에 알리면서 퐁당퐁당 다이빙 소리까지 선사하는 그런 악질적인 놈들일 때도 예외 없는지를.
그날은 아침에 광주로 가는 일정이었다. 보안검사를 마치고 탑승구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데, 배가 살살 아파왔다. 좋지 않은 시간대다. 제주공항의 아침은, 낮보다는 한산하지만 화장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새벽부터 준비를 서두른다고 볼일을 보지 못한 관광객들이 많다. 이 무리들과 함께 기다리다가 내가 어떤 칸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면서까지 고통을 해결할 자신이 없었다. 광주까지 비행은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참을 수 있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이륙했다. 또 신호가 온다. 하필 창가 자리였고, 옆 두 좌석에는 큰 체격의 중년 남성이 코까지 골며 자고 있다. 이들을 깨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들이 내가 나갈 수 있게 일어나주지 않고 대충 무릎만 당긴다면? 움직이다가 실수할 것 같았다. 화장실 갈 사람의 권리가 더 중요하니 눈치볼 필요 없이 당당하면 되겠지만, 안 봐도 되는 눈치까지 보는 사람도 많다. 어찌하나 고민하는 중에 비행기는 난기류에 꿈틀거리고 내 속은 꿀렁거린다.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안전벨트를 풀려는 순간, 기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Cabin crew, please be seated.” 승무원도 앉으라는 판에 화장실을 어찌 가겠는가. 참고 참아 다시 용기를 내려는데, 곧 착륙이라서 안된다는 방송이 나온다. 30분 비행에 5분은 상승한다고, 10분은 흔들린다고, 10분은 착륙한다고 자리에서 이동조차 못하니 공항에서 해결하지 못한 게 더 후회스럽다. 여기저기를 주무르는 모든 민간요법을 동원해가며 버티고 버텼다. 아뿔싸. 비행기가 착륙 직전에 다시 날아오른다. 고 어라운드, 착륙복행이었다. 기장은 바람이 심하다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다. 비행기가 복행을 하면 다시 적정 고도까지 올라가서 크게 선회를 하면서 내려오기에 시간이 꽤 걸린다. 최소 20분이다.
어렵게 착륙했고 나는 아직 참고 있다. 긍정적 사고도 총동원했다. 광주공항은 비행기가 혼잡하지 않기에 100% 탑승교로 이동하지 않았던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평으로 화장실까지 걸을 수 있다는 거다. 흔들거리는 이동식 계단을 내려간다는 건, 어휴 생각만으로 끔찍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다. 탑승교가 고장이란다. 내려서 걸어가란다. 버스도 없다. 200~300m 거리의 아스팔트를 거북이보다 느린 속도로 걸으니 직원들이 재촉한다. 위험하니 빨리 이동하라고. 죽을 맛이었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대합실로 들어왔다.
이런 날을 위해 눈여겨보았던 조용한 화장실로 향했다. 몸을 비틀고 비틀면서 문을 열고 닫고 잠금장치를 걸었다. 그 순간, 갑자기 단체 용변객들이 들이닥친다. 모든 칸이 사람으로 찼다. 허리띠 푸는 소리, 지퍼 내리는 소리, 바지 내리는 소리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이어진다. 그리고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 흡사한 음이 공간을 가득 메운다. 거기에 내 소리를 섞으면 될 일인데, 나는 다시 괄약근에 힘을 준다. 박자가 안 맞아도 아무도 관심 없을 건데 말이다. 왜 이런 걸까?
화장실 공포증일까? 특정 상황에서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을 지니는 사회불안장애 중 하나인 화장실 공포증은 흔한 심리적 질환이다. 과민성대장증후군만큼은 아니지만 ‘수줍은 방광 증후군’도 꽤 유명한 용어인데, 방광만 수줍겠는가. 장도 부끄러움을 탄다. 어린이집에는 이런 아이들이 제법 있는데, 배변 행위와 냄새를 피해야 하는 것으로 반복학습을 하다가 나타난 부작용으로 분석되곤 한다. 누가 볼까 봐의 두려움이 더 커서 화장실에서 몸이 이완되지 않는 건데, 어른이 된다고 싹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심할 경우, 결혼을 하고도 배우자가 집에 있으면 야외 화장실을 찾기도 한다. 수줍은 장 증후군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오지 않는 쪽에 가깝고, 나는 죽을힘까지 짜내 나오는 걸 막는 것이니 차이가 있지만 생각이 지나치다는 측면에서 크게는 비슷할 거다.
기억을 더듬어본다. 이 정도로 소심했던가. 표현이 틀렸다. 적확히 짚자면, 화장실에서 망설이는 나를 소심하다고 평가한 적은 없었다. 옆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를 눈치 보는 정도로 내 성격을 이해했을 뿐이다. 고쳐야 될 결함으로는 이해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 가득한 화장실일지라도 어쨌든 해결했지 지금처럼 억지로 버티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간다. 나는 어떻게 된 게 이런 것도 망설이냐고. 그리고 하나가 더 붙는다.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현대사회의 기운이 그렇다. 쫄지 말라는 게 조언처럼 부유하더니, 단지 무례하지 않으려고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하는 이들은 “쫄았냐?”라는 소리를 듣는다. 야무지고 다부지게 살라는 게 덕담이 되더니, 그저 타인을 배려해 욕심부리지 않는 사람들은 “물러 터졌다”는 주변의 수군거림을 마주한다. 대범한 결단력이란 말은 얼마나 흔해졌는가. 그와 동시에 평범하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자신을 원망한다. 소심하고 우유부단하다면서 말이다.
내 성격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니, 배변 활동조차 주체성이 없는 내 모습이 패배자 같다. 지나치게 긴장하고,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고, 지나치게 민감해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이해한다. 난 왜 이조차도 당당하지 못하고, 이 간단한 것조차 망설이냐는 자기 비난이 이어지고 이게 반복되니 위축된다. 일말의 용기도 다 사라진다. 그때 옆의 칸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소리는 참으로 부럽다. 화장실에서 뻔뻔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내가 밉다. 아니, 이 사회가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