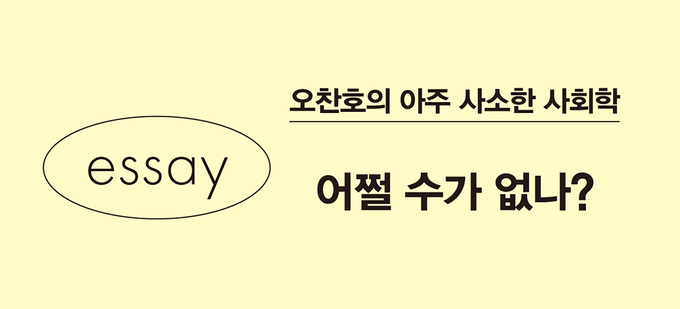최근 한 매체와 원고료 조율을 했다. 인연을 맺은 지가 꽤 되었음에도 원고료가 그대로인지라, 계속 같은 금액이면 동기부여가 안된다면서 매우 정중하게 투덜거렸다. 이 바닥에서 일을 하면서 응어리가 맺힌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수년간 칼럼을 쓰면서 원고료 협상을 해보지도 못한 경험이 많았다. 요즈음은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용기를 내고 있다. 거창하게 말하면, 이 생태계가 상식적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사명감도 약간은 있다.
협상은 성공했다. 하지만 불안이 엄습했다. 돈을 밝힌다고 소문나면 어쩌나 하는 통상적인 수준이 아니었다. 내가 시대착오적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입장을 바꿔, 여러 글들을 모아 하나의 매거진을 완성하는 편집장이 나였다면 무슨 말을 뱉었을까? 아마, 이럴지도 모른다. “일일이 저자 섭외하고 원고 독촉하고 편집하는 것도 귀찮은데, AI에게 다 맡길까? 그럼, 정말 효율적일 거야.”
에이, 그게 어떻게 글이냐면서 화를 냈던 게 불과 얼마 전이다. 나는 2024년 7월에 출간한 책에서 할리우드 작가조합의 파업을 말하며, 인공지능이 대본을 쓴다는 건 정말로 끔찍하다며 분노했다. 영화 <기생충>이 (유명한 영화평을 빌리자면) ‘상승과 하강을 명징하게 직조해’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는 건 결국 그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란 존재가 했기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다. 불평등이 인류의 문제임을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말해준다면 그런 작품을 감히 예술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에도 그렇게 쓸 수 있을까? 모르겠다. 입장이 변한 건 없지만, 작가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저 결의가 대단히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1년 사이에 세상은 너무 달라졌다. AI에게 무엇을 묻는 게 아니라, 아예 쓰라고 한다. 사람들은 그게 뭐가 어때라면서 무덤덤하게 적응하는 중이다. AI를 이용해 글을 쓰는 건, 스타 작가가 보조 작가 여러 명을 두고 드라마 대본을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모두가 스타 작가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음을 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았다.
그런가? 스타 작가도 보조 작가를 두기 전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스스로 책임졌다. 지구상의 모든 글이 그랬다. 이 경험 위에서 AI에게 마지막 한줄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공존이고 협업일 거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지시한다. 첫줄부터 베껴서 자신의 글로 포장한다. 그 포장지조차 입히지 않는 사람들도 허다하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친구는 이런 일화를 전한다. 한 학생이 리포트 주제의 사례로 난해하기로 명성이 자자한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를 기가 막히게 응용한 게 반가워 강의시간에 칭찬을 했는데, 막상 글쓴이는 영화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다. 게다가 설명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중요하지 영화를 봐야지만 글을 쓸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반문까지 했다. 마치 AI의 글솜씨가 수준급인데 왜 사람이 직접 써야 하냐는 투였다. 중요한 건 이를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다.
가만 보니, 나도 도서관을 가는 횟수가 달라졌다. 이메일이 보편화되면서 편집자 얼굴 한번 안 보고도 출간을 할 때는 마냥 편리하다고만 느꼈는데,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건 많이 무섭다. 시간을 절약하니 다행이라고? 내가 도서관을 갈 때, 처음에 생각했던 그 책만을 집는 게 아니다. 옆 칸의 그 책, 앞 칸의 이 책을 괜히 한번 본다. 누가 반납하고 쌓아둔 책의 목록도 슬쩍 눈에 담는다. 그러다가 삼천포에 빠진다. 정보의 바다에 직접 뛰어들었기에, 나는 전혀 몰랐던 도서들과 무작위로 접촉하며 정보망을 넓힌다. 이 우연, 쓸데없는 짓일까? 지금은 그런 취급을 받는 모양새다. 정보를 빨리 취득하는 것만이 중요해진 세상에선, 정보의 교류와 충돌 그 과정의 지난함과 혼란 속에 싹트는 새로운 사고를 만날 일은 더 이상 없다. 몇번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멀홀랜드 드라이브>를 안 보고도 응용하는 세상은 어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를 봤다. 원작이 동일한 코스타 카브라스 감독의 <액스,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는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개인을 괴물로 만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당백 자료라 나는 대학 강의를 하던 시절에 수십번은 소개했다. <어쩔수가없다>가 개봉하자, 15년 전에 내 수업을 들었다는 기자에게 연락을 받았다. 이런저런 안부 끝에 남긴 영화평은 이랬다. “가브라스 감독 영화보다 더 무서웠어요. 제가 기자라서 더 그렇게 느꼈나봐요.” <액스,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의 마지막 장면은 섬뜩하다. 경쟁자를 다 죽이고 가족의 범죄도 덮어버리며 원하는 걸 얻은 브뤼노 다베르(호세 가르시아)는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을 만난다. 그가 다베르를 째려보면서 영화는 끝난다. 너도 죽였으니, 나도 죽일 거라고 말하는 느낌이 오싹했는데 <어쩔수가없다>의 엔딩을 보니까 그나마 다정한 마무리였던 거다. 그래도 계속 사람이 돌고 도니까 말이다.
어쩔 수 없다며 살인까지 저지른 끝에, 사람 한명 없는 공장의 책임자가 된 유만수(이병헌)는 어떠한가. 째려보는 사람조차 없다. 그리고 엔딩 자막과 함께 등장하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듯한 강철 로봇들의 묵직한 벌목 작업은 노골적이다. 로봇은 거친 숲으로 들어가서 알아서 나무를 고르고, 자르고, 베고 잘만 운송한다. 인간과 기계의 대결, 그런 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려주면서 말이다. 그 기계의 소음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 따위는 없다고 천명하는 것 같았다. 만수는 괜히 전문가랍시고 막대기로 종이 뭉치를 퉁퉁 때려보며 인간이 필요한 이유를 드러내려고 발버둥치지만, 그걸 이미 로봇이 알아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그 기계들은 거들먹거리지도 않는다. 나처럼 원고료 안 올려준다면서 불만을 가질 리도 없다. 어휴, 다시는 그런 소릴 해선 안되겠다.